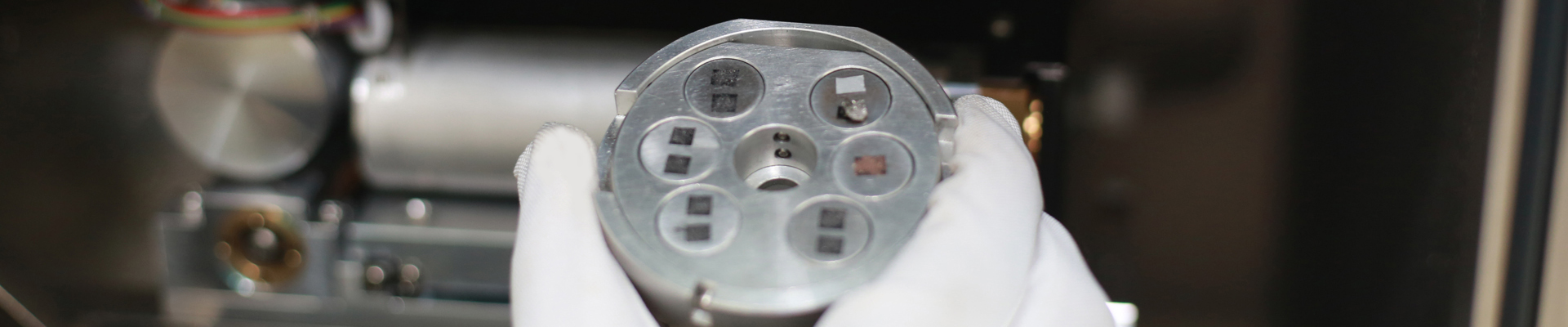
《나는 지금도 해방후 어머님과 함께
해방된 조국이 첫 양력설을 맞을 때였다.
온 나라 인민들은 민족재생의 환희에 휩싸여 새 삶에 대한 가슴벅찬 희망과 포부를 안고 뜻깊게 설을 맞이하였다.
만경대의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는 이날
만경대고향집은 전에없이 활기를 띠고 흥성거렸다.
할머님께서는 아직 보신적 없는 장손며느님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산에서 싸우느라니 고생인들 오죽했으랴 하고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시였다. 할아버님께서도 심정은 꼭 같으시였다. 들메나무아지에서 새벽까치가 우짖는 날이면 할아버님께서는 말없이 토방에 나오시여 열려진 사립문을 내다보군 하시였다.
이제 이 사립문으로 항일의 녀
이날
만경대로 가시는 이 길은 초행길이였으나 너무도 마음속깊이 자리잡은 고장이여서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는 급히 사립문밖으로 나가시여 증손자분을 부둥켜안으시였다.
할아버님께서는 한참동안 장손며느님과 증손자분을 보시고 감개무량해하시였다.
《우리 집 장손며느리가 새별같은 증손자를 앞세우고 들어오는구나! 오늘이 이 집의 명절이다!》
이러시는 할아버님의 눈가에서도 뜨거운것이 번쩍이였다.
예지로운 얼굴, 정기어린 눈매, 그 어느 구석엔가 이름할수 없는 강직함과 굳세임이 엿보이면서도 끝없이 부드럽고 뜨거운 정이 넘치는 장손며느님의 모습에 할아버님도 할머님도 기꺼움을 금치 못하시였다. 동네사람들도 그이의 부드러우면서도 슬기와 예지에 넘치는 모습에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할아버님께서는 절을 받으시다가 그대로 증손자분을 얼싸안으시고 마디굵은 손으로 얼굴이며 어깨를 쓰다듬어주시였다.
《…어쩌면 우리
할아버님의 두볼에는 또다시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이어 고향집에서는 소박한 축하연이 있었다. 상에는 고향집과 이웃집들에서 준비한 소박하면서도 성의가 깃든 음식들이 올랐다.
할아버님께서는 《너희들이 큰상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음식을 큰상으로 생각하거라.》라고 말씀하시였다.
《모진 세상을 이기고 산 보람이 있구나!
이 기쁜 날에 먼저 간 사람들도 눈을 감을게다. 고맙다. 아가야, 네가 와서 오늘은 만경대집이 더 환해지는구나!》
할아버님께서는 이렇게 회심의 이야기를 하시며 잔을 내시였다.
할머님께서는 《우리야 무슨 고생이 있었겠냐. 그래도 집이라고 지붕을 쓰고 따뜻한 구들에서 지내지 않았느냐. 고생이야 너희들이 했지. 눈우에서 쪽잠을 자고 풀뿌리를 씹으며 15년을 산에서 싸웠으니 그 고생이 오죽했겠느냐.》하시며 장손며느리의 손을 잡고 자꾸 쓰다듬으시였다.
할머님께서는 생각을 더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그때에 고생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왜놈들과 그 앞잡이들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다니면서 손자가 있는 곳을 대라고 날뛰였으나 나는 그놈들에게 절대 굽히지 않았다. 비록 배운것은 없었으나 속은 꿋꿋이 살아있었다.
나는 그놈들에게 〈이놈들아! 내 손자가 네놈들을 가만두지 않을것이다. 네놈들이 아무리 날뛰여도 내 손자를 찾지 못할것이다.〉
그랬더니 그놈들이 겁을 먹고 함부로 나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 그놈들도 나를 잘못 다쳤다가는 유격대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줄 알았던지 감히 더 못되게 굴지 못하더라.
…이제는 모든것이 모질던 지난날의 얘기가 되였구나. 산 사람이야 뭐라느냐! 오늘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사람들이 원통하지…》
할머님께서는 목이 꽉 메시여 더 말씀을 잇지 못하며 눈물을 닦으시였다. 나라를 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고향을 떠나신 맏아드님께서 애석하게 돌아가시고 또 셋째 아드님께서 돌아가신지는 벌써 몇해째던가! 사랑하는 며느님과 둘째 손자분마저 이역의 하늘아래 묻히셨다는 소식이 들려온지도 퍼그나 오래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할머님께서는 그 불행을 잊으실수 없었다.
일가분들의 마음을 가슴아픈 추억으로부터 기쁨에로 돌아오게 하신 분은 어리신
어리신
어리신
할아버님께서는 《대끝에서 대가 난다고 우리 증손자도 과시
만경대의 밤은 깊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네가 깨여났구나. 밤이 깊었다. 더 자거라.》
다심하신 할머님의 말씀이였다.
《늙은이들은 잠이 없다. 우리 걱정은 말고 더 자거라. 산에서 바위를 베고 자느라 어느 하루 구들신세를 져보았겠느냐!》
그래도
《네가 어려서 집을 떠나 고생이 많았다더구나. 어린 나이때부터 나라를 찾겠다구 그 한마음 모질게 먹구 억척같이 살아왔다더구나.
나라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을 때 어느 집 처마밑이라고 조용할 날이 있었겠느냐! 우리 집에서도 나라를 찾겠다고 숱한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어느 하루도 편히 보낸 날이 없었다.
처마에서 락수물이 떨어지는 밤에도 어디 가서 헐벗고 떨지나 않는지 장밤을 뜬눈으로 새웠느니라.
네 시할머니는 빈 물레를 돌리였다. 왜 빈 물레를 돌리는가 물으면 속이 타서 그런다고 하더구나. 그러나 이젠 그것이 다 옛말이 되였다.
애국의 넋을 자랑으로 삼아온 이 집안의 혈통을 이어갈 증손자를 데리고 네가 왔구나! 네가 이 집안에 꽃을 피워라. 이 애를 잘 키워 나라의 창창한 대를 잇게 하여라.》
절절하고 뜨겁게 울리는 할아버님의 말씀의 마디마디는
만경대고향집에서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