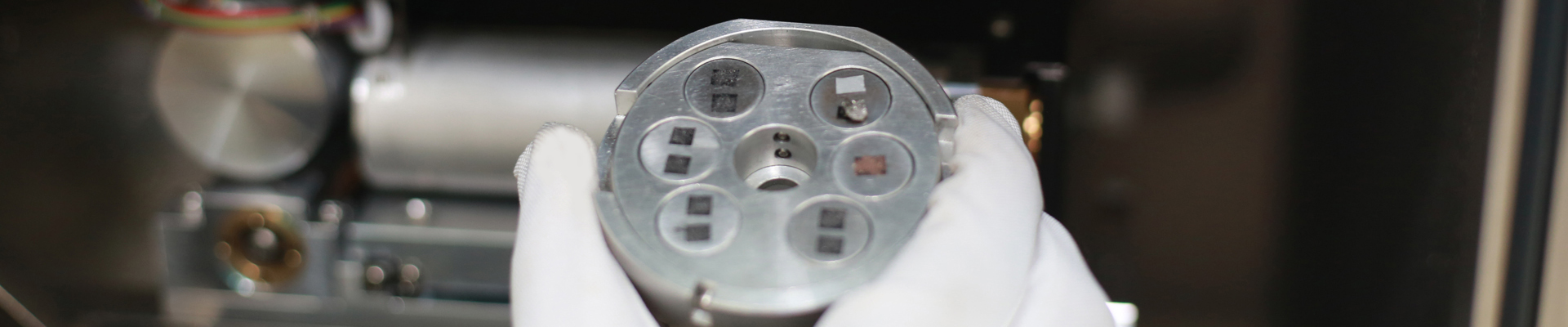
어느해 12월에 있은 일이다.
흐릿해진 하늘에서 소담스러운 하얀 눈송이들이 쏟아져내리는 날이였다.
오랜 병환으로 치료를 받던 인민군대의 한 지휘관은 아침부터 넋을 잃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고있었다.
방금전에 저녁에 찾아오시겠다는
(
그도 그럴것이 오래동안 치료를 하였지만 차도는커녕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전염성이 강한 몹쓸 병으로 일체 면회사절이라는 선고까지 받게 된 그였던것이다.
(가까운 동지들은 물론 가족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던 내가 어찌…아, 그리운
육신의 고통보다 마음의 괴로움이 더욱 그를 괴롭히였다.
이러는 사이에 겨울의 짧은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져갔다.
게다가 저물녘에는 바람까지 왜 이다지 모질게 불어치는지.
온종일 기쁨 절반, 괴로움 절반으로 그의 몸은 녹아내리는것만 같았다.
드디여
그는 지금껏 다잡던 마음을 잃고 무작정 달려나갔다.
다음순간 그는 엎어질듯 급히 멈추어섰다. 그이의 가까이로 다가서면 안된다는 자각이 또다시 우뢰처럼 뇌리를 쳤던것이다.
《저는…저는 모실수 없는…제발 어서 돌아가주십시오.》
하지만
알고있다고, 찾아온 손님을 대접은 못할망정 쫓아버리려는 법이 어디 있는가고 무랍없이 말씀하시며.
감격이 극하면 말문이 막힌다고 그는 쏟아져내리는 눈물만 손등으로 훔치였다.
그처럼 우러러 뵈옵기를 소원하였건만 그는 머리를 외면한채 그냥 흐느끼기만 하였다.
내가 찾아오는것만으로 동무의 병이 나을수 있다면 얼마든지 오겠소. 앓으면 가까운 사람들의 손길이 그리워지는 법인데 부모가 없으니 누가 돌봐주겠소.…
인간과 동지에 대한
동행한 일군들모두도 흐느껴 울었다.
이것은
동지를 위하여 죽을수도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수 있고 혁명의 길에서 한번 손을 잡으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변함없이 동지적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것이 우리
이런
이런 위대한 인간, 용암보다 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신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