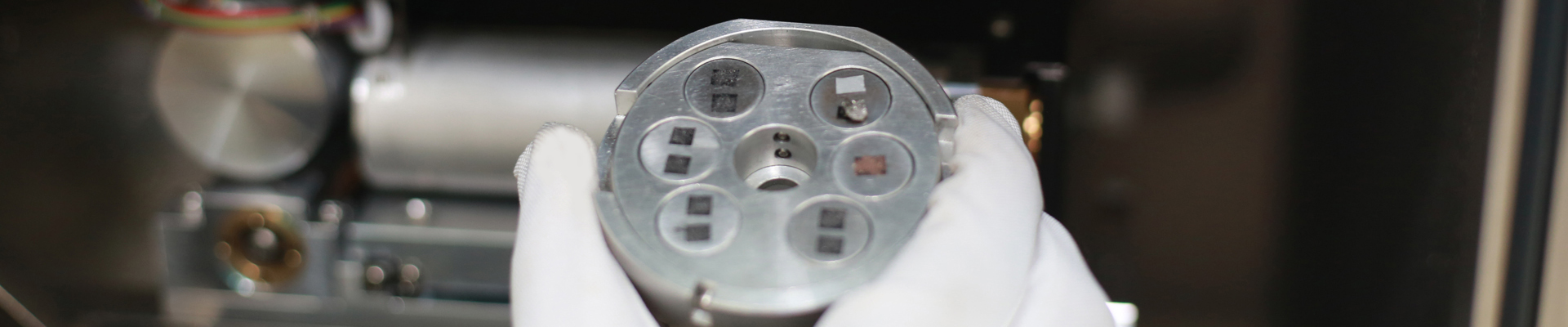
사람들은 때로 범상하게 흘러가는 생활의 어느 한 계기에 가슴을 쿵 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아안는 경우가 있다.
어느날 새벽이였다.
고즈넉한 정적이 깃든 대동강유보도를 거닐며 시상을 무르익히고있던 나는 도란도란 들려오는 이야기소리에 상념에서 깨여났다.
예닐곱살 되였을 어린 소년이 할
《할아버진 날보고 새벽산보를 나가자 하구선 또 호미랑 들고 일하러가나요?》
《할아버진 이렇게 날마다 꽃이랑 나무랑 가꾸는게 가장 즐거운 산보란다.》
《우리 아버진 매일 공부만 해서 과학자가 되였는데 할아버진 매일 나무를 가꾸어서 무엇이 되나요?》
《글쎄… 꽃이랑 나무랑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애국이라고 하지. 우리 철이도 크거들랑 훌륭한 애국자가 되여야 한단다…》
《애국자?… 애국자는 과학자보다 더 높나요?》
어느덧 그들의 말소리는 멀어져갔지만 애국자는 과학자보다 더 높은가고 묻던 어린애의 동심어린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나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는것이였다.
애국자.
그것은 사람의 사회적지위나 직무를 나타내는 그 어떤 직위나 명예칭호도 아니다.
시나 소설을 통하여 그리고 생활의 많은 계기마다에 너무나도 많이 써오고 범상하게 느끼군 하던 말이다.
허나 오늘날에 와서 애국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에는 누구나 저도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절세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눈굽이 젖어드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이겠는가.
한 나라, 한 민족의
그래서
하기에
정녕 애국자라는 그 값높은 칭호의 높이는 과연 어디까지이던가.
몸소 삽을 드시고 장시간에 걸쳐 나무도 심으시고 팔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잡풀까지 뽑아가시며 애국에 대한 혁명강의를 들려주시던 절세의 애국자!
내 나라를 존엄높은 인민의 강국으로 우뚝 세워주시려 불철주야 애국헌신의 길을 걷고 걸으시는 민족의
그렇다.
애국자,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직무나 직위, 명예칭호에도 비길수 없는 시대와 력사가 안겨주는 가장 값높고
대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