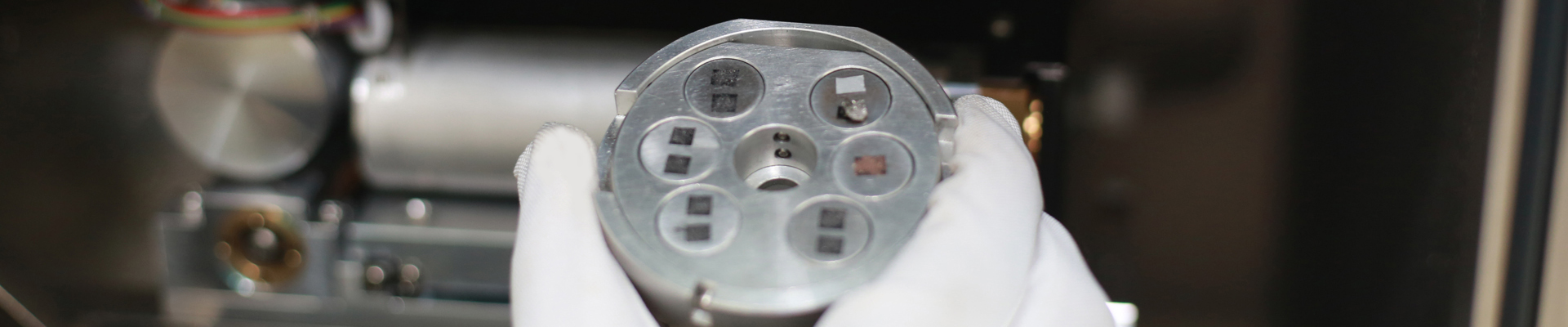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1950년대 패전의 수치와 수십년에 걸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파산의 교훈도 모르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다하고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용사들의 전설적인 위훈담과 피어린 자욱들을 가슴에 새겨안으며 여러 호실들을 돌아보던 나는 미제의 패망상을 보여주는 한장의 사진앞에서 멈춰섰다.
주체42(1953)년 7월 27일 판문점의 정전협정조인식장에서 항복서에 서명을 하고있는 패전장군 클라크의 몰골이 찍혀진 사진이였다.
항복서!
물론 미국놈들은 64년전 7월의 그날에 패자의 수표를 남긴 그 문건을 항복서라고 부를리 만무하다.
한때는 조선에서의 참패를 회억하기조차 부끄러워 7월 27일이 올 때마다 조기를 띄우던 놈들이 이제 와서는 《잊혀진 승리》를 떠들며 저들의 패전상을 《승리》로 둔갑시켜보려고 안깐힘을 쓰고있는 형편이니…
그러나 세계의 정의와 량심은 영웅적조선인민과 한편에 서서 한목소리로 웨친다.
《1950년대 조선전쟁의 패배자는 아메리카! 그들이 바친 항복서에는 침략자 미국이 들쓴 수치와 참패가 그대로 비껴있다!》
항복서!
《독립》의 성조기를 인디안들의 피바다우에 날린 그때로부터 백여차에 걸치는 전쟁에서 단 한번도 패해본적이 없다던 아메리카제국이 그 비대한 몸뚱아리에 어울리지 않게 흰기를 들고 판문점으로 찾아와 청소한 동방의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써바친것은 틀림없는 항복서였다.
바로 그래서 세계력사에는 3년간의 조선전쟁이 미제를 내리막길로 떠민 시초로 당당히 기록되여있는것이 아닌가.
그날의 참패가 그 옹졸한 속통에서 너무도 내려가지 않아 수치를 만회해볼 기회를 노리며 미국놈들은 지난 60여년간 좀스러운 장난질을 또 얼마나 많이도 해왔던가.
지금도 세상사람들은 주체57(1968)년 우리 나라 령해에 기여들어 정탐활동을 하며 돌아치던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였던 그때를 어제인듯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보복》과 《전면전쟁》을 떠들면서 항공모함을 비롯한 대병력을 조선반도에 밀어넣으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던 미국, 온 세계가 열핵전쟁의 참화를 안아올 제3차세계대전이 박두했다고 아우성치게 만들었던 제국주의괴수는 그때에도 또다시 자그마한 나라 조선앞에 사죄문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찌 그뿐인가.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를 기회로 다시 기세가 오른 미제가 1990년대에도 《조선반도핵위기》라는 먹장구름을 이 땅에 몰아왔으나 종당에는 또 하나의 항복서나 다름없는 조미기본합의문에 서명할수밖에 없었으며 대통령담보서한까지 가져다바치며 세계앞에 톡톡히 망신만 당하지 않았던가.
그후에도 《3.3.3붕괴설》이니, 연착륙전략이니, 전략적인내정책이니 하는것들을 고안해내며 온갖 발악을 다하였지만 미국에게 차례진것은 참패와 굴욕뿐이였다.
바로 이것이 력사의 진실일진데 대대로 승리의 전통만을 이어온 우리의 공화국앞에서 지금 이 시각 천하불한당 트럼프를 괴수로 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떤 몰골을 보이고있는가.
한편으로는 《적대시의사가 없다.》, 《제도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희떠운 소리를 줴치면서도 핵전략자산들을 괴뢰지역의 땅과 하늘과 바다로 연방 끌어들이며 최후의 발악을 다하고있지 않는가.
그러나 양키들은 오산하고있다.
천하의 둘도 없는 정치사상강국으로 세계의 정점에 우뚝 선 우리 공화국은 무적의 핵강국, 로케트맹주국, 군사대국의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고있다.
미국놈들이 조금 움쩍거리기만 한대도 우리는 주저없이 정의의 타격을 가할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는 재가루만 흩날리는 죽음의 불모지로 변할것이다.
지구를 박차고 7월의 창공높이 날아오른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시험발사의 장쾌한 뢰성이 온 우주에 이것을 선언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의 심장은 더욱더 세차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1950년대 미제가 퍼붓는 포탄과 폭탄의 불비속에서도 간고한 싸움을 벌려 전승의 축포를 쏴올린 전세대들처럼 반미대결전의 승리를 위해 이 한몸 기꺼이 바쳐 싸우리라.
우리의
바로 이것이 위대한 전승세대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가야 할 우리들의 숭고한 본분임을 자각하며 나는 보무당당히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나섰다.
용사들의 넋이 비낀듯한 붉은 저녁노을이 나의 몸과 마음을 뜨겁게 감싸안아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