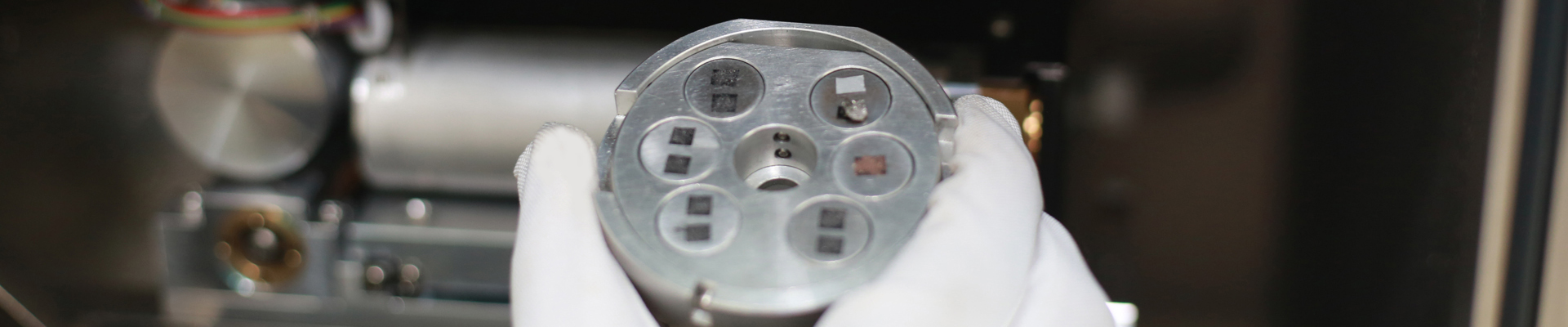
《애국심은 자기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 자기 고향마을과 일터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싹트게 되며 그것이 나아가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자기 고유의 전통인 애국의 전통이 굳건히 이어져 나라를 사랑하고 위하는 열렬한 애국심이 나어린 아이들의 작은 가슴에도 《보이지 않는 나무》로 소중히 뿌리내려 무성한 거목으로 자라나고있다.
언제인가 나에게는 뜻밖에도 딸애의 가슴속에 간직된 그 《보이지 않는 나무》를 보게 되는 기회가 차례졌다.
며칠전 저녁이였다. 여느때없이 잠에 곯아떨어진 딸애의 이불깃을 여며주고나서 그가 공부하던 책들을 정돈하던 나는 문득 딸애의 일기장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방금 쓴듯한 딸애의 일기를 훑어보던 나는 무엇인가 쩌릿하는 감정을 느끼며 일기의 내용들을 다시 눈여겨 읽기 시작하였다.
…
나는 오늘 오후 선생님과 동무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다.
여러종의 나무모들가운데서 우리 나라의 국수 소나무를 심겠다고 동무들은 저마다 선생님에게 졸라댔다. 철무동무는 자기는 앞으로 소나무처럼 강의한 신념의 강자 인민군대정찰병영웅이 되겠다고 하고 이악쟁이 연옥동무는 언제 어디서나 변심을 모르는 애국과학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선생님의 팔소매가 떨어지게 졸라대여 끝내 몇그루 안되는 소나무모를 다 가지고갔다.
남달리 키가 작고 체소한 나는 동무들의 드살에 밀리워 그리고 수종이 좋은 나무모라는 선생님의 명령절반, 얼림절반에 하는수없이 기름밤나무모 서너그루를 받아가지고 학교뒤 나지막한 언덕에 올랐다.
(오늘 소나무를 심는 철무동무랑 연옥동무랑 앞으로 진짜 영웅이 되고 애국과학자가 되지 않을가? 난 다른 애들보다 몸도 체소하고 마음도 어진데 오늘 이런 기름밤나무나 심어서…)
내가 생각에 잠겨 나무모를 심을 구뎅이를 파고있는데 등뒤에서 갑자기 웅글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구. 어린 처녀애가 <보이지 않는 나무>를 심는구나.》
뒤를 돌아보니 멋지기는 하나 땀내 푹 배인 제복을 입은 산림감독원아저씨가 나도 들어가 숨을만큼 큰 물초롱을 내려놓으며 이마의 땀을 훔치고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아저씨는 감독원인데 왜 이렇게 큰 물초롱에 물을 담아가지고 힘들게 다니나요?》
《허허. 이게 바로 내 임무니까.》
《임무? 오 그러니까 나랑 우리 동무들이 나무모에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이 물초롱으로 물을 길어오게 할려구요?》
《하하하! 그럴수도 있지.》
《참. 그런데 이자 <보이지 않는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나요? 난 지금 이렇게 솜털이 보시시한 기름밤나무를 심고있는데…》
《허허, 어린 소년단원이 호기심도 연구심도 많은걸. 그 나무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자라고자라면 더욱더 무성해지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내 나라에 아름다움과 풍요함과 강성함을 더해주는 거목으로, 기둥으로 되지.》
《거목? 기둥?》
《이 기름밤나무만 봐라. 이 나무는
이 나무의 뿌리가 흙에 묻히면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를 거목으로 자래우는듯이 <보이지 않는 나무>도 비록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을수는 있지만 많이 묻힐수록 좋고 깊이 묻을수록 더 씽씽 자라게 되지. 그러니 그 <보이지 않는 나무>가 어떤것인지 우리 총명한 소년단원이 한번 맞쳐보아라.》
산림감독원아저씨는 땀방울이 송골송골한 내 코잔등을 다독여주며 큰 초롱의 물을 나의 작은 초롱에 찰랑찰랑 부어주고는 그 큰 물초롱을 훌쩍 들고 다른 동무들이 나무를 심는 곳으로 씨엉씨엉 걸어갔다.
《많이 묻힐수록 좋고 깊이 묻을수록 씽씽 자라는 나무?》
깊은 생각에 골몰하던 나의 머리속에는 문득 얼마전 로동신문에 실렸던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참가자들과 기념식수를 하시면서
(야! 애국심!)
오늘 나는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다. 《보이지 않는 나무》와 함께
…
나는 딸애의 마음속에서 아니 전체 조선인민의 심장속에서 거목으로 자라나 푸르러 설레일 《보이지 않는 나무》를 그려보며 일기장을 덮었다.